최 영 (목회와신학연구소 소장)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으로 혹독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목회현장은, 교회의 규모나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곳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는 있지만, 교회의 현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한 논의는 없는 것 같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 어떠한 미래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아직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올가을 닥칠 것이라는 ‘2차 팬데믹’에 대한 소식은 우리를 참으로 우울하게 한다. 현재 지역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예배당에 모여 공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언제든 ‘비대면 언택트 방식’의 예배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중심의 예배’라면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될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는 말씀과 더불어 ‘성찬’이 있는 예배이다. 개혁교회 전통은 성찬을 설교의 확장으로 이해한다. 말씀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감각 기관을 통해서 다시 ‘보고’, ‘만지고’, ‘맛보고’, 그리고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말씀 선포와 성찬은 예배의 중요한 두 축을 이룬다.
이런 맥락에서 성찬식은 매주 거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혁자 칼뱅은 매주일 성찬식이 거행되기를 원했지만, 제네바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일 년에 네 차례 거행하는 것이 개혁교회에서 하나의 관례가 되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칼뱅이 아니라 칼뱅의 반대자들의 후예들이다. 최근 매월 한 차례 성찬식을 거행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비대면 언택트 방식’의 예배 상황이 계속된다면, 한 달에 한 차례 성찬을 거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것이다. 온라인 방식의 성찬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온라인 영상을 보며, 각자의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의 종식을 마냥 기다리며 아예 거르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접 떡과 포도주를 정성껏 준비하여, 동영상 속의 목사의 집례에 따라 떡을 들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방식의 성찬은 성찬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만약 온라인 방식의 성찬이 목사가 집례하는 성찬식을 단순히 구경하는 방식이든지, 또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는 ‘느낌’만을 얻게 하는 것이라면, 성찬의 의미를 파괴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찬이 반드시 목사가 집례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팬데믹의 상황에서 온라인 방식의 성찬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그리스도교 전통의 처음 몇 세기 동안은 성례전의 신학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적었다. 2세기에 들어서 일반적인 성례의 성격에 관한 약간의 논의가 디다케와 이레네우스의 저술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성례전의 정의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성례전적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어거스틴(354-430)이었다.
그 당시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자기네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가톨릭 사제나 주교들이 집행한 세례나 서품은 무효요, 도나투스 사제들에게 다시 세례나 서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성례전의 효능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개인적 자질에 좌우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거스틴은 도나투스주의가 인간적 매체의 자질을 지나치게 강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타락한 인간으로서 누가 순수하고 불순한지, 가치있고 무가치한지를 구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교회를 성자와 죄인들의 ‘혼합체’로 이해한 그의 이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서, 성례전의 효능은 그것을 집행하는 개인의 자질이나 공로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을 처음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거한 것임을 천명한다. 성례전적 효능의 근거에 대한 이와 같은 상이한 두 견해는 아래의 두 개의 라틴어 구호로 표현되었다.
- 성례전은 “일하는 자의 일 때문에(ex opere operantis)” 유효하다.
- 성례전은 “이루어진 일 때문에(ex opere operato)” 유효하다.
도나투스주의의 입장은 “ex opere operantis”와 일치하고, 어거스틴의 입장은 “ex opere operato”와 일치한다. 후자의 견해는 서방교회의 규범이 되었고, 16세기 개혁자들도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였다. 전자의 견해는 종교개혁의 일부 과격파들에 의해 옹호되었고, 지금은 특별히 거룩함이나 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파들 내에서 그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다.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즉 우리를 위해 이미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진 일 때문에(ex opere operato)” 유효한 것이라면, 팬데믹으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이 집례자의 축사와 지시를 따라 가정에서 행하는 성찬의 유효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영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에게로 연합시키시기 때문이다(칼뱅).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꿈같은 일이라고들 말한다. 단지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 시절이 마치 ‘실낙원’처럼 아련히 떠오른다. 언제 이 환난이 끝날지, 앞으로 어떤 더 큰 시련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교회의 머리와 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이다.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환란을 이겨내자!(롬 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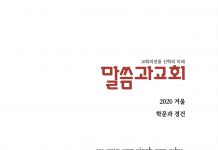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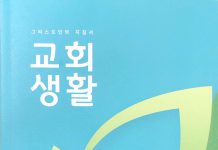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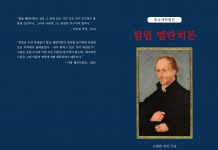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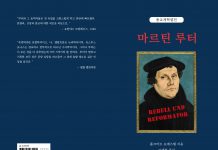








귀한 글 감사합니다. 성찬식의 유효성을 집례자의 자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푼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도나투스 논쟁을 통찰력으로 해결하였으며 동감하는 바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