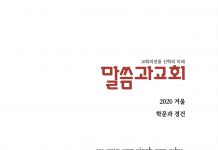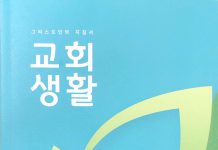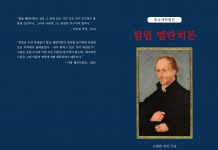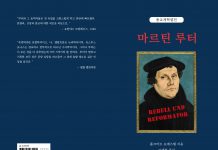약속이 딸린 첫 계명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효도를 가르쳐 왔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레 19: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잠 23:24-25)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신 5:16)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출 21:17; 레 20:9) 하셨거늘 /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마 15:4-6)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 6:1-3)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골 3:20)
집에 보낼 편지(寄家書) – 이안눌(李安訥, 1571 ~ 1637)
1.
欲作家書說苦辛 (욕작가서설고신)
집에 보낼 편지에 괴로움 말하려 해도
恐敎愁殺白頭親 (공교수살백두친)
흰머리 어버이 근심하실까 저어하여
陰山積雪深川丈 (음산적설심천장)
그늘진 산, 쌓인 눈 깊이 천장인데도
却報今冬暖似春 (각보금동난사춘)
도리어 올 겨울 봄처럼 따뜻하다 말하네
2.
塞遠山長道路難(새원산장도로난)
먼 변방 산은 길고 도로는 험하니
蕃人入洛歲應闌(번인입락세응란)
북쪽 변방 사람 서울 닿으면 세밑이리.
春天寄信題秋日(춘천기신제추일)
봄날 보내면서 가을 날짜 썼으니
要遣家親作近看(요견가친작근간)
부모님은 근래 보낸 편지로 여기시리.
– 東岳先生集卷之一 > 北塞錄 > 寄家書
이 시는 동악 (東岳) 이안눌(李安訥 1571~1637)이 함경도에서 한양에 있는 집으로 편지를 보내며 지은 시 두 편이다. 그는 29살 되던 1599년 10월 북평사(北評事)로 함경도 종성에 부임하여 일년 동안 지냈다.
이 시를 짓게 된 연유는 다음과 같다. 집에서 이안눌에게 편지와 겨울옷을 보냈는데 해를 넘겨서야 겨우 받았다. 아내가 자신의 몸 치수대로 지어 보낸 그 옷이 너무 커 입을 수가 없었다. 따뜻한 남쪽 고향을 떠나 눈이 깊게 쌓이는 북방 추운 산악 지대에서 고생스럽게 지내는 동안 몸이 많이 야윈 탓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편지에 쓰려고 하니 막상 걱정하실 부모님 얼굴이 떠올랐다. 이안눌은 오히려 ‘올해 겨울은 마치 봄처럼 따뜻하다’라고 썼다. 비록 북풍한설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도, 그는 그리함으로써 부모님을 안심시켜 드리려 했다.
두 번째 시에도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이 역력하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한양까지 길이 멀고 험했다. 지금 인편에 부쳐도 그 사람이 연말에나 도착할 것 같다. 그래서 편지에 아예 가을날에 쓴다고 적었다. 이 편지를 읽는 어머니는 최근 소식으로 알고 안심하시리라 여겼던 것이다. 물론 그가 편안히 잘 지낸다고 한 것은 말짱 거짓말이었다.
그 편지를 받고서 모친은 행간을 읽지 못하셨을까? 아마 편지에 묻어 있는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셨으리라.
짧은 이 시에는 부모님께 심려를 끼치지 않으려는 아들과, 몸 고생이 심할 아들을 아끼는 부모님 마음이 오롯이 들어 있다.
내일은 ‘어버이날’이다. 평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효를 생각하는 오월이다. ‘내 자식들이 내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하라.’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알려진 말이다.
지방 민요에 “뒤 터에 목화심어 송이송이 따낼 적에 좋은 송이 따로 모아 부모 옷에 많이 두고 서리 맞아 마구 따서 우리 옷에 놓아 입자”는 구절이 있다. 다음은 양주동시가 쓴 ‘어머니 마음’이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앓을 사 그릇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 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효자로 이름난 曾子(증자)가 효에 대해 “큰 효는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아래는 잘 봉양하는 것이다 孝有三 大孝尊親 其次弗辱 其下能養(효유삼 대효존친 기차불욕 기하능양)”라고 했다. – 禮記(예기)·祭義(제의)편
공자는 말했다. “요즈음은 부모에게 물질로써 봉양함을 효도라고 한다. 그러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써 구별하랴(금지효자 今之孝者 시위능양 是謂能養 지어견마 至於犬馬 개능유양 皆能有養 불경 不敬 하이별호 何而別乎)” – 論語(논어)·爲政(위정)편
부모님에게 음식 옷 돈으로 하는 양체지효(養體之孝) 영구지효(養口之孝)는 최소한의 효도이므로 그보다는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며 마음을 편안히 드리는 양지지효(養志之孝)가 진정한 효도라는 듯이다.
樹欲靜而風不止(수욕정이풍부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은 멈추지 않고 子欲養而親不待(자욕양이친부대)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리지 않는다. 往而不來者年也 (왕이불래자년야) 한 번 가고는 다시 오지 못하는 것이 세월이요 不可再見者親也 (불가재현자친야) 보고자 해도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어버이로다. 이것은 한시외전(韓詩外傳) 9권과 논어 치사편(致思篇)에 나오며, 흔히 풍수지탄(風樹之嘆)이란 사자성어로 알려져 있다.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의 훈민가(訓民歌)도 있다.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 분 곳 아니면 이 몸이 사라시랴 하늘 갓튼 가업슨 은덕을 어데 다혀 갑사오리.’
다음은 노계(蘆溪) 박인로(朴仁老 1561~1642)의 조홍시가(早紅煤歌)다. ‘쟁반 위에 놓은 붉은 홍시가 곱게도 보이는 구나. 유자가 아니라 해도 품고 갈 수도 있지마는 품어 가도 반가워하실 분이 안계시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이것은 육적의 회귤고사(懷橘故事)에서 따온 시다.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는 격몽요결(擊蒙要訣) 제5 사친장(第五 事親章)에 다음과 같이 썼다.
첫째 一事一行 毋敢自專 必稟命而後行(부모를 모실 때는 어떤 일이든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물어보고 행하라!)
둘째 若事之可爲者 父母不許 則必委曲陳達 頷可而後行.만약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하여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곡진하게 이유를 설명하여 부모의 마음을 설득한 후에 행하라!)
셋째 人家父子間 多是愛逾於敬.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공경보다 넘어서서는 안 된다.)
넷째 父母之志 若非害於義理 則當先意承順.부모의 뜻이 의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들어 주어야 한다.)
다섯째 父母有疾 心憂色沮 捨置他事.(부모가 아프거나 병이 드셨다면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라!)
그는 또 말했다.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은 도심(道心)이고, 배고프면 먹고자 하고 추우면 입고자하는 것은 인심(人心)이다. 대체로 인심은 크게 자라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절제해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도심(道心)은 마땅히 보호하고 길러서 넓게 퍼지게 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