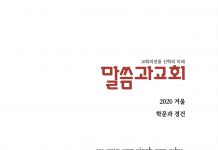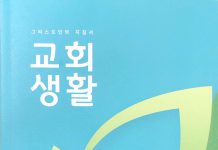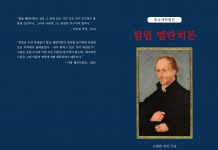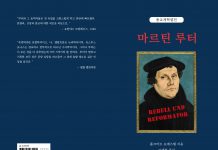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
36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막 8:36-37)
이릉(李陵) – 허암 정희량(虛庵 鄭希良 1469~?)
自負平生大丈夫
평생을 대장부로 자부하였으나
英雄歎息未應無
영웅도 탄식은 응당 없지는 않았으리.
功嫌一髮多慙霍
터럭 하나같은 공도 꺼리어 곽거병에게 더욱 부끄러웠고
愧在千秋合謝蘇
천추의 수치로 남아 소무에게 마땅히 사절하였네.
漢法不饒飛將種
한나라 법은 비장군의 후예에게 너그럽지 않아서
胡塵虛擲泰山軀
오랑캐 땅에 부질없이 태산같은 몸을 던졌구나.
氈場白首誠何事
추운 땅에서 백수로 성심을 다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莫說高人富貴孤
高人의 부귀가 孤高하다고 말하지 말라.
시의 전반부에서 시인은 장군 이릉에 대한 후대의 평가를 실었다. 이릉(李陵 ?~주전 74)은 한(漢)나라의 이름난 무장이었다. 흉노와 전쟁 중에 그는 흉노의 배후를 기습하여 이광리를 도왔다. 돌아오는 길에 무기·식량이 떨어지고 8만의 흉노군에게 포위되었다. 그가 거느린 5000의 군사로는 흉노족의 8만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중과부적이었다. 그때 이릉은 자신과 5천명 부하의 목숨을 지키려고 투항했다. 당시 한나라의 군법은 전쟁에서 패하면, 패전의 이유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처형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흉노에 항복한 후 선우(單于)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는 우교왕(右校王)이 되어 선우의 군사·정치의 고문으로 활약하였다.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쌓은 무공은 곽거병(霍去病)과 비교되어 도리어 수치로 여겨졌다. 흉노에 사신을 갔다가 볼모로 잡혀 온갖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고상하게 절개를 지킨 소무(蘇武)와 비교되어 역사에 부끄러운 인물로 평가되었다.
사마천은 이릉의 항복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미움을 사 궁형을 당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남는 자신의 입장을 보임안서(報任安書)에서 이렇게 썼다.(『한서(漢書)』『사마천전(司馬遷傳)』 및 『문선(文選)』 권41)
사람이란 본디 한 번 죽을 뿐이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기도 하고 어떤 죽음은 터럭만큼이나 가볍기도 하니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까닭입니다.(人固有一死, 死有重於泰山, 或輕於鴻毛 用之所趨異也) .
이 시에서 정희량은 이릉이 태산처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투항하였다고 변호했다.
* 곽거병(霍去病 주전 140~117)은 前漢 武帝 때의 장군으로 정예부대를 이끌고 대군보다 먼저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는 전법으로 흉노를 토벌하여 한제국의 영토 확대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그러나 그는 불과 24세로 죽자 무제는 크게 슬퍼하고 일찍이 그가 대승을 거둔 祁連山(天山)의 형상을 세워 그의 무공을 기렸다.
* 소무(蘇武 주전 60~?)가 무제 때인 주전 100년에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체포되어 항복을 강요받았다. 그는 끝까지 절의를 굽히지 않고 이를 거부했다. 결국 그는 황야로 보내져 19년에 걸친 억류생활을 했다. 그가 억류 상태에서 땅속 움집에 살 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받아먹고 담요를 뜯어 씹어 먹으며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여 소경설(蘇卿雪)이란 말이 생겼다.(한서 권 54 소건이광전) 나중에 그는 북해(北海)로 보내져 양을 치며 지냈다. 그때에도 한나라의 지팡이(절 節)을 놓지 않고 지냈다 하여 소경장절심(蘇卿杖節心)이란 말이 나왔다.
소제(昭帝)가 즉위한 후 흉노와의 화해가 성립되어 주전 81년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 뒤 그의 충절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았다. 그는 훗날 蘇武孤節로 추앙받는 인물이 되었다. 소무고절이란 말은 歲寒孤節(세한고절) 傲霜孤節(오상고절)과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이 시 뒷부분에서 시인은 자신의 입장을 묘사했다. 鄭希良은 무오사화(戊午史禍)에 연루되어 조위(曺偉 1454~1503)와 함께 용만(龍彎 = 의주)에 유배되었다. 그는 극소에서 유배자의 신세로 추위와 싸우며 살았다. 放免된 뒤 그는 종적을 감추었다.
그는 곽거병(霍去病)의 공적이나 소무(蘇武)의 고상한 절개(孤節)을 꿈꾸지 않았다. 비롯 훗날 이릉과 같다는 평가를 받아도 좋으니 태산처럼 크고 소중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했다. 이 시에서도 ‘태산’은 목숨과 같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을 의미한다.
그는 태산같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은둔생활을 선택했다. 오늘날 세상에는 목숨이 아니라 자기 자리·자기 소유를 지키느라 온갖 추태를 부리며 주변 사람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에게 소무고절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정희량의 십분의 일 만큼이라도 닮으라고 하면 지나친 욕심일까?